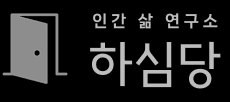목요기초탄탄 1학기 에세이 후기- 안미선
2024.05.04 조회수 67회
1학기 에세이 후기
본문
<글쓰기에 대한 소회>
지금까지 글쓰기는 읽기가 어느 정도 된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읽기단계라고 스스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에세이 쓰기가 주어지면 도망가고 싶은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번 에세이를 쓰는 와중에도 이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마감 이틀전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머릿속으로 떠돌던 생각들과 메모들이 연결되지 않아 스토리가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마감 날 아침 7시, 눈을 뜨자 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 마감 10분전에 글을 올렸다.
그리고 글을 올리고 난 후 나는 어떤 ‘한 순간’을 경험하였다. 다음날 지인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것이 몰입이 가져다 준 카타르시스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나 자신이 소멸된 순간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로써 글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다. 그리고 에세이에 대한 코멘트를 받았다. 스승과 도반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 내가 있어 참 좋은 행복한 시간이었다.
<에세이 수정분>
앎에서 비롯되는 불편함에 대하여
감이당에서 일주일에 2시간 강의를 듣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하였다. 10년전 그 때 강의를 듣고 집으로 오던 길에 느꼈던 그 행복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온 듯 하였다. 그렇게 철학자들의 사유의 세계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들의 방대한 앎도 부러웠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지식이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찰하는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반들과 세미나를 하면서는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도 좋아 보였다. 그리하여 이것이 나의 공부 목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에세이에서 ‘나는 왜 공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선뜻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번 학기에도 같은 주제가 주어졌다. 조원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기 위하여 또는 한번도 되어본 적 없는 자기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조원들에게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런 나에게 한 조원이 ‘공부’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지식의 즐거움
맞다. 나는 어느 순간 지식 그 자체,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좋았다. 처음 감이당에 왔을 때, 철학 책이 어려워 거의 읽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요즘에야 비로소 철학자들이 이전 철학과 어떤 지점에서 변곡점을 만들어 내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 독해가 즐거웠다. 독해 능력은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비례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왜 이 앎의 즐거움을 나의 공부의 목적으로 선뜻 답하지 못하였던 것일까, 그렇다면 이와 더불어 공부로 인한 어떤 불편함도 동시에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니였을까?
내가 처음 공부를 시작하였을 때, 식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았었다. 그리하여 강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아주 잘 받아 주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곤 하였다. 공부한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여서 그런가, 아니면 퇴직한 남편이 이전보다 빈번해진 시댁모임에 참석하자고 하였을 때, 세미나 발제 때문에 못간다고 하여서 그런가,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무엇인가 납득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정신의학의 권력』을 읽으면서 지식의 기능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다.
지식이 도덕요법으로 작용할 때
푸코에 의하면 지식와 권력은 상보적 관계이다. 즉 권력이 지식을 생산하고, 이 지식이 권력을 생산한다. ‘규율권력’이란 이러한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규율권력은 규범이라는 하나의 질서를 통해 작동한다. 이 규범에 따라 대상을 옳고그름으로 나누는 것이 도덕요법이다.
19세기초 정신과 의사였던 프랑수아 뢰레는 이 도덕요법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이 치료과정에서는 오로지 의사의 규범만이 법칙으로 작용한다. 환자의 가치관은 중요하지 않다. 이 상황에서 환자는 타자의 의지에 순종하는 주체로 거듭날 때만 정상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대하는 이 모습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올초 남편 친구 부부와 여수에 갔을 때의 일이다. 여행 첫날 점심을 먹기 위하여 식당을 찾던 중 남편이 장어탕 집을 추천하였다. 남편 친구 부부는 내키지 않아 하였지만 남편은 이전에 몇 번이나 가보았던 곳이라며 맛을 장담하였다. 내가 보기에 그 부인이 장어탕 자체를 싫어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그곳으로 갔다.
그렇게 시작된 식사에서 다행히 밥과 밑반찬이 맛있었고, 그 부인도 맛있게 먹었다. 밑반찬전부를 리필하여 다 먹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빈 반찬그릇을 가지고 주방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빈 손으로 돌아 왔다. 순간 나는 남은 반찬 먹으면 됐지 뭐하러 또 가져 오려고 하느냐고 하였다. 그 순간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다.
이 뜻밖의 상황에 모두가 당황스러웠지만 제일 황당한 것은 나였다. 어찌어찌 그 자리가 수습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남편은 친구 부인이 맛있게 먹던 반찬을 눈여겨 보았다가 그것을 더 갔다 주려고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부인도 그 점이 고마웠다고 하였다. 나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 오로지 책에서 읽은 ‘인류세’라는 단어가 내 행위의 지침이 되었다. 그리하여 반찬을 남기지 말아야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뿐인가, 상대도 이 지침에 어긋나면 교정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공부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하고 싶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나를 당황스럽게 하였다.
지금까지 글쓰기는 읽기가 어느 정도 된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읽기단계라고 스스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에세이 쓰기가 주어지면 도망가고 싶은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번 에세이를 쓰는 와중에도 이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마감 이틀전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머릿속으로 떠돌던 생각들과 메모들이 연결되지 않아 스토리가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마감 날 아침 7시, 눈을 뜨자 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 마감 10분전에 글을 올렸다.
그리고 글을 올리고 난 후 나는 어떤 ‘한 순간’을 경험하였다. 다음날 지인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것이 몰입이 가져다 준 카타르시스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나 자신이 소멸된 순간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로써 글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다. 그리고 에세이에 대한 코멘트를 받았다. 스승과 도반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 내가 있어 참 좋은 행복한 시간이었다.
<에세이 수정분>
앎에서 비롯되는 불편함에 대하여
감이당에서 일주일에 2시간 강의를 듣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하였다. 10년전 그 때 강의를 듣고 집으로 오던 길에 느꼈던 그 행복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온 듯 하였다. 그렇게 철학자들의 사유의 세계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들의 방대한 앎도 부러웠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지식이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찰하는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반들과 세미나를 하면서는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도 좋아 보였다. 그리하여 이것이 나의 공부 목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에세이에서 ‘나는 왜 공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선뜻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번 학기에도 같은 주제가 주어졌다. 조원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기 위하여 또는 한번도 되어본 적 없는 자기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조원들에게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런 나에게 한 조원이 ‘공부’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지식의 즐거움
맞다. 나는 어느 순간 지식 그 자체,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좋았다. 처음 감이당에 왔을 때, 철학 책이 어려워 거의 읽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요즘에야 비로소 철학자들이 이전 철학과 어떤 지점에서 변곡점을 만들어 내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 독해가 즐거웠다. 독해 능력은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비례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왜 이 앎의 즐거움을 나의 공부의 목적으로 선뜻 답하지 못하였던 것일까, 그렇다면 이와 더불어 공부로 인한 어떤 불편함도 동시에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니였을까?
내가 처음 공부를 시작하였을 때, 식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았었다. 그리하여 강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아주 잘 받아 주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곤 하였다. 공부한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여서 그런가, 아니면 퇴직한 남편이 이전보다 빈번해진 시댁모임에 참석하자고 하였을 때, 세미나 발제 때문에 못간다고 하여서 그런가,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무엇인가 납득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정신의학의 권력』을 읽으면서 지식의 기능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다.
지식이 도덕요법으로 작용할 때
푸코에 의하면 지식와 권력은 상보적 관계이다. 즉 권력이 지식을 생산하고, 이 지식이 권력을 생산한다. ‘규율권력’이란 이러한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규율권력은 규범이라는 하나의 질서를 통해 작동한다. 이 규범에 따라 대상을 옳고그름으로 나누는 것이 도덕요법이다.
19세기초 정신과 의사였던 프랑수아 뢰레는 이 도덕요법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이 치료과정에서는 오로지 의사의 규범만이 법칙으로 작용한다. 환자의 가치관은 중요하지 않다. 이 상황에서 환자는 타자의 의지에 순종하는 주체로 거듭날 때만 정상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대하는 이 모습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올초 남편 친구 부부와 여수에 갔을 때의 일이다. 여행 첫날 점심을 먹기 위하여 식당을 찾던 중 남편이 장어탕 집을 추천하였다. 남편 친구 부부는 내키지 않아 하였지만 남편은 이전에 몇 번이나 가보았던 곳이라며 맛을 장담하였다. 내가 보기에 그 부인이 장어탕 자체를 싫어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그곳으로 갔다.
그렇게 시작된 식사에서 다행히 밥과 밑반찬이 맛있었고, 그 부인도 맛있게 먹었다. 밑반찬전부를 리필하여 다 먹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빈 반찬그릇을 가지고 주방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빈 손으로 돌아 왔다. 순간 나는 남은 반찬 먹으면 됐지 뭐하러 또 가져 오려고 하느냐고 하였다. 그 순간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다.
이 뜻밖의 상황에 모두가 당황스러웠지만 제일 황당한 것은 나였다. 어찌어찌 그 자리가 수습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남편은 친구 부인이 맛있게 먹던 반찬을 눈여겨 보았다가 그것을 더 갔다 주려고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부인도 그 점이 고마웠다고 하였다. 나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 오로지 책에서 읽은 ‘인류세’라는 단어가 내 행위의 지침이 되었다. 그리하여 반찬을 남기지 말아야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뿐인가, 상대도 이 지침에 어긋나면 교정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공부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하고 싶었는데, 이러한 경험은 나를 당황스럽게 하였다.
- 이전글인간을 넘어서 -늙음과 젊음, 남과 여 발제문(p.169~끝) 24.05.16
- 다음글1학기 에세이 후기 _ 김수민 24.05.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